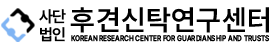칼럼 낡은 책상 옆에 낡은 의자 11개(유시완)
페이지 정보

본문
회복의 공간 난다 칼럼
낡은 책상 옆에 낡은 의자 11개
회복의 공간 난다 팀장 유시완
때는 2011년 여름. 벽시계의 작은 바늘은 2를 가리키고 있었다. 투박하고 허름한 느낌, 크기는 1980년대 비디오 가게를 연상하게 되는 곳. 무더운 여름의 열기도 바닥의 한기 앞에 어찌하지 못하는 공기를 느끼게 하는 공간, 정신장애인 당사자 9명이 모여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허름한 책상에 불편한 의자를 서로 끼어 앉아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10분 뒤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낡은 유리 철문을 열면서 인사했다. 부산 태생인 듯한 말투이지만 무척 순한 느낌의 인상이었다. 앉아 있는 무리 중에 새로운 얼굴을 본 순한 사투리 억양의 남자는 그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어. 처음 오셨나 보네. 제 이름은 최명수(가명)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역시 무던하고 순한 느낌의 여유로운 부산 사투리였다. 20대 남자는 다소 급한 어투로 바로 대답했다.
“네…. 저… 전… 유동현. 입… 입니다.”
“네.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와요. 자. 그나저나 오늘 이야기 주제 정했어요?”
그는 ‘유동현’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의 어눌한 발음과 떠는 듯한 손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힘들어 축 처진 몇몇 사람의 모습도 익숙한 듯처럼 보였다. 단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보단 어떤 얘기를 말하고 싶냐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말했다.
최명수씨가 온 후에 모임의 분위기가 활기를 띤 느낌이었다. 성향이 제각각인 11명이 모여서 이야기 주제를 정하는 것만 30분이 걸렸다. 최명수씨는 칠판 서기를 자처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은대로 검은색 보드마카로 적어 내려갔다.
최명수씨는 2천 원을 꺼내면서 돈을 모아 과자를 사자고 이야기했다. 과자는 최명수 씨와 다른 40대 후반 남성 김건우(가명) 씨가 1분 거리의 슈퍼로 갔다. 사온 것은 콜라 1.5L 한 병과 오렌지 주스 한 통, 초코파이 한 상자. 과자봉지 4개 정도였다. 과자봉지 4개를 넓게 펼쳐 과자 종류도 섞어서 나눠 먹었다.
그렇게 모여서 과자 먹고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나누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여름이다. 그날 그들이 모여있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였다. 정신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토요일 낮을 무료하게 보냈었던 그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보려고 발걸음을 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것이 없었다. 특별함이라면은 방명록은 형식상으로 적고, 서류상으로 체계적인 느낌도 아니었고 공간과 구성원 간의 소통은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 그러다보니 참여 인원도 자주 바뀌었다.
그때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보았다. 11년간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다. 이 나라에서 느끼는 정신장애인의 보장체계는 많아졌다. 그 예시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직업의 영역을 들 수 있다.
그전에는 단순 행정직 사원, 대형마트 보안요원, 카트 수거, 호텔 세탁물 업무 배치, 병원 조리업무, 지하철 택배업무 등의 업무형태의 분포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당사자 동료지원가 및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일상생활 유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조건의 임금을 받는 조건의 자리가 생겼다.
당사자가 자신의 생업을 위해 일자리를 갖는 일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 그 초라해 보인 공간에서 강산의 변화 주기를 한 번 겪은 나는, 현장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때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방명록은 누구에게는 별 의미 없는 물건 들이겠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의 자리를 같이해주는 열 명이 채 되지 않는 당사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지역에서 고립된 사람. 사회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존재.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정신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도 이어 나가는 이들이 있기에 누군가가 앉았던 투박한 의자도 제 역할 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할 것이리라. 이 마음으로 나의 첫 칼럼의 맺음말을 작성해본다.
- 이전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생각보다 복잡합니다(조미정) 23.06.12
- 다음글[1호] 2023년 5월 소식지 23.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