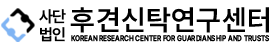칼럼 하늘을 보고 싶었다(석현)
페이지 정보

본문
회복의 공간 난다 칼럼
하늘을 보고 싶었다
회복의 공간 난다 활동가 염석현
15년이 지났다. 수능을 마친 해방감은 반대로 나를 구속했다. 증상의 발현으로 몸은 비쩍 말라갔고, 정신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나 스스로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가족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나의 흥분상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결국 집으로 구급대가 들어섰고 나는 첫 강제 입원을 겪게 되었다.
강제 입원 첫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난 보호사에게 제압되어 독방에서 주사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나 보니 그들은 환자복을 건넸고 나는 남자 환자들이 사용하는 방에서 자리를 배정받았다. 무언가 잘못한 듯 주눅 들었고, 통제돼야 할 대상처럼 느껴졌다.
병동에서의 생활을 얘기하자면 침대는 좁아서 몸을 뒤척이면 떨어지기 일쑤였고, 화장실 문은 잠금쇠가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안전의 문제 때문이겠지만 잠이 들 시간에도 늘 소등하지 않는 것이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았고, 회복을 위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게 됐다.
하늘을 보고 싶었다. 입원실의 유리에 부착물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 옥상에 올라갈 때를 제외하면 하늘을 볼 수 없었다.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됐다. 병원 밖에서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박탈당했을 때 내 정신은 더욱 힘을 잃어갔다.
나를 병동 밖으로 이끌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증상의 호전을 가져다준 것이 오로지 약물 때문이었을까. 나를 견디게 해준 것들을 떠올려본다. 면회가 가능해지고 거의 매일 찾아와준 가족, 아픔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났던 당사자 간의 인간애, 아무 대가 없이 이뤄졌던 배려들이 내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병동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각자의 증상을 가지고 남극의 차가운 바람 같은 아픔을 허들링 하듯 함께 견딘 존재들. 아무 범죄 없이 그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자체로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 했던 순간들이 가끔 떠오른다.
나는 그 후 4번 정도 강제 입원을 경험했고, 6년 전 잠정적인 마지막 입원을 끝으로 장애등록을 하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첫 입원이 강렬했기에 그때가 기억나곤 한다. 정신질환자를 수감자처럼 다루었던 그때와 지금은 인권적으로 많이 신장해 있기를 바란다.
정신질환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아니라 들어야 할 또 다른 목소리이다. 억압하고 감시하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터놓고 얘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음글정신병원에서 채식하기(왈왈) 23.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